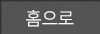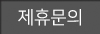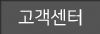[CEO 칼럼] 역사와 기억을 담는 도시재생
아주경제
올해 초쯤 열린 페터 춤토르라는 건축가의 대담회가 기억난다.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그에 대한 국내 건축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 시간의 짧은 시간만으로 그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작가의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울림을 우리 사회에 남겨줬다.
장소성에 대한 그의 해석은 올해 들어 급부상한 도시 재생에 하나의 지침을 건넸다. 모든 장소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일상에 남겨 있는 기억 또는 경험으로 또다시 그 역사를 느끼게 한다는 것과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거나 보존하는 게 재생이라는 것이다. 누구의 해석보다도 명쾌했다.
요즘 들어 전 국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다. 그 지방화 속에서 급속한 발전은 도시의 이미지를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사실 지방화가 바로 세계화라는 얘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사람·건물·자연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그 도시에 사는 지역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봐야 한다.
대전의 경우, 근·현대기에 설치된 철도와 고속도로로 국토의 교통 중심도시라는 명맥을 이어왔다.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이 형성돼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을 통해 연구 인력이 대거 유입한 상황이다. 이후 둔산동 시대를 통해 도시 핵이 분리되면서 상권과 주거가 이분화됐고 도시가 그만큼 성장했다.
성장의 모습을 보면, 지역민의 자립적 성장보다는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성장이 대부분이다. 지역민의 특성상 지역감정이 강하지 않아 정착하기는 좋은 도시이긴 해도 다 함께 지역성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게 한둘이 아니다.
사회지표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타 도시에 비해 높게 평가돼 있기는 하다.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가 교통의 도시나 행정의 도시보다 압도적이다. 대전의 미래 이미지 역시 ‘과학의 도시상’을 추구한다. 도시의 발전과 비슷한 맥락의 지표가 보여주듯이 이미 지역에서의 삶을 통해 장소의 역사를 함께 인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 하나의 도시 역시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고 너무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 도시에 어울리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채우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쇠퇴한 도심의 건축물은 쓸모를 따지지도 않고 허물어진다. 수십년의 기억은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나 완전히 사라진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복제해 놓은 듯 비슷비슷한 건축물이 거리에 즐비하다.
이렇다 보니 도시 재생에 대한 접근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도시 재생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 세대를 살아왔던 건축과 공간을 탐구하는 동시에 건축과 도시가 주는 의미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스타 건축가를 섭외하기보다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본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장소성에 대한 그의 해석은 올해 들어 급부상한 도시 재생에 하나의 지침을 건넸다. 모든 장소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일상에 남겨 있는 기억 또는 경험으로 또다시 그 역사를 느끼게 한다는 것과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거나 보존하는 게 재생이라는 것이다. 누구의 해석보다도 명쾌했다.
요즘 들어 전 국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다. 그 지방화 속에서 급속한 발전은 도시의 이미지를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사실 지방화가 바로 세계화라는 얘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사람·건물·자연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그 도시에 사는 지역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봐야 한다.
대전의 경우, 근·현대기에 설치된 철도와 고속도로로 국토의 교통 중심도시라는 명맥을 이어왔다.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이 형성돼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의 조성을 통해 연구 인력이 대거 유입한 상황이다. 이후 둔산동 시대를 통해 도시 핵이 분리되면서 상권과 주거가 이분화됐고 도시가 그만큼 성장했다.
성장의 모습을 보면, 지역민의 자립적 성장보다는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성장이 대부분이다. 지역민의 특성상 지역감정이 강하지 않아 정착하기는 좋은 도시이긴 해도 다 함께 지역성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게 한둘이 아니다.
사회지표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타 도시에 비해 높게 평가돼 있기는 하다.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가 교통의 도시나 행정의 도시보다 압도적이다. 대전의 미래 이미지 역시 ‘과학의 도시상’을 추구한다. 도시의 발전과 비슷한 맥락의 지표가 보여주듯이 이미 지역에서의 삶을 통해 장소의 역사를 함께 인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 하나의 도시 역시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고 너무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 도시에 어울리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채우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쇠퇴한 도심의 건축물은 쓸모를 따지지도 않고 허물어진다. 수십년의 기억은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나 완전히 사라진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복제해 놓은 듯 비슷비슷한 건축물이 거리에 즐비하다.
이렇다 보니 도시 재생에 대한 접근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도시 재생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 세대를 살아왔던 건축과 공간을 탐구하는 동시에 건축과 도시가 주는 의미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스타 건축가를 섭외하기보다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본다.

김용각 대전시건축사회장/김용각 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본인 제공]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핫포토